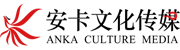시
털갈이(외5수)
(탕원) 홍연숙
지저분한 털을 달고 어슬렁대는 똥개가 보일 때면
나의 추문들을 꺼내여 읊는다
반백의 나이에 추해진 몰골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하고 싶은 짓거리가 너무 많아
떨어지는 꽃을 찬양하는 것도
세월에 어쩔 수 없이 루추해짐을 기억시키는 것 보다
시들어감을 붙잡아
견고해지기 위해서이다
길 가다가 수캐를 보면
남들이 있던 말던
그대로 흘레를 붙는 것도
지당한 일이라고 깨달았으니
이 만큼 살아진 것도
가다 오다 만났던 가벼운 인연들이
결코 가벼운게 아니였음을 안다
쌍년인 내 몸에 달려
한오리씩 희여지다가
한오리씩 빠지고
다 빠지더라도
유명하다는 털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나의 력사는 더 더러울 것이며
누구도 감히 나를 잡종이라 놀리지 못하도록
내 털 한오리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나비
계획없는 방랑자여
할 일없이 빈둥대는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지
부지런한 꿀벌은 알기나 할까
흔들리는 금빛의 리듬
스치는 은빛의 섬광
다채롭고 정제된 문자로
이꽃 저꽃 쫓아다니며
으시대고 유혹한다
늘어나는 건물들
멸종위기의 동물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환란과
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그 짓거리에 가벼워진다
지는 꽃이라
이내 사그라지지만
경이로움은
영원히 빛난다
지속하고 변치 않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피로에 지쳐가고 있지 않는가
잠간 듣는 음악에
금방 끝나는 사랑에
이 세상의 고단한 삶들이
견디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나비가 없다면
가벼운 날개짓이 없다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인이 없다면
우린 살아갈 수 있을까
강
1
저 강의 비밀을 아냐구
외롭다고 힘들다는 이놈 저놈 별놈까지 끌어들인 걸
아냐구
그 중에 장난 삼아
에라 한번쯤이야 하고 발목까지 담갔다가
감기는 물살에 후닥닥 뛰여가는 놈도 있고
풍덩 빠졌다가 겨우 살아 남아 기여가는 놈도 있고
손만 넣고 휘휘 젓다가
코 풀고 힝 가버린 놈도 있었다는 걸 아냐구
2
맑은 물이 흐르고
향기가 흐를 때는
해와 달이 몸 담그고 질그덕이며
물비늘로 출렁이고
매끄러운 수초사이로
비린 봄 냄새를 실어오는
그 깊은 속살을
호시탐탐 노리는 낚시군들이
시도 때도 없이 걸터 앉는다
3
야심찬 수컷들은
전쟁을 끊임 없이 일으키고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르면서도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며
기어코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땅이 하늘이 뒤집혀 다 죽어
죽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음의 강은 영문도 모르고
게우듯이 철철 흐르기만 하는데
넘어진 갈대들만이 못 다한 이야기를 조신하게 펼쳐간다
꽃감
나는 엄마의 껍데기를 보지 못했다
엄마의 속살에 기생하면서
풍만한 살이 쪼글쪼글 마르다가
양똥처럼 새카만 꽃감이 되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고
나는 엄마를 잊었고
낮이나 밤이나 꽃감만 먹었다
남들이 다 하는 그 흔한 엄마 생각도 나에게는 없었다
원흉은 꽃감이였다
우뢰울고 번개치는 날이면
꽃감은 단 맛이 더 진했고
별도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면 말랑말랑하게 입안으로 감겨 들어 꿈속에서도 나는 웃었다
그 많은 꽃감이
나의 입으로 들어가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도 남아 돌아 아깝지도 않았고
달달이 월경으로 흘러보냈고 트럼으로 방구로 각질로 비듬으로 심지어 똥으로 오줌으로 마구마구 써버렸다
영원할 것만 같은 나의 꽃감이
꼭지만 달랑 남아
꽃감 생각에 엄마를 찾았더니
내가 끌고 다니던 부대(負袋)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들렸다
석류의 장례식
할 말도 못하고 가버린 문드러진 생이여
태풍에도 끄떡 없더니
향기를 다 잃고 풍장을 치른다
목구멍까지 차 올랐던
알알히 박힌 말들이
연어알 처럼 새롭게 탄생되여
세상으로 퍼졌을 말들이
뱉지도 못하고 괴질이 났다
어떤 웨침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었을까
말이 죽었다
수많은 말들이 죽어
억겹의 돌이되여 바람에 날린다
저 단단한 것이
바람처럼 가벼운 것은
말이 풍화되어 모두의
마음속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창을 열고 보는 것은
이 늦 가을에
활짝 핀 장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전의 내가 밑둥의 가시에 박힌 것 같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 뿌리끝에 박힐 것만 같아
해마다 베여지는 장미를 바라 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자꾸 자라는 줄기를
나도 모르게 무성해지는 잎들을
이른 봄에 더 퍼지기 전에 잘라내야 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를 길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욕구로 뻗쳐오르는 나를 잘라야 합니다
의미있는 나로 되는 건
잘린 것들이 가시로 박히는 겁니다
장미의 가시는 스스로 찌른 거라는 걸 아시는지요
남을 찌르기 전에
먼저 나를 찌른 답니다
매일 창을 열고 보는 것은
떨어져나간 몸의 상처들이
아파오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에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